감독이 한국의 상황을 특정해 만든 영화는 아니었겠지만, 이 작품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한국 정치였다.
광기에 사로잡힌 지도자 케네시 마샬은 윤석열에, 그의 아내 일파는 김건희에, 기지 내 방송을 제작하는 팀은 권력에 부역하는 언론과 참모들에 오버랩된다. 행성 생물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영웅이 되려는 마샬의 욕망과 전쟁을 일으켜 통일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이 겹쳐지는 건 단순한 우연일까? (물론 감독이 이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 무렵에 영화는 이미 제작 마무리 단계였을 테니까.)
미키는 민중의 상징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다. 생활인이자 희생자로서, 사회 구조에 끊임없이 희생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태어난다.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로 대체되는, 힘 없는 이들의 슬픈 초상이다. 그는 순응하며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히 살아가다, 극도의 모순에 몰린 후에야 비로소 비로소 저항한다(미키 18).
기지의 대원들, 미키와 함께 싸우든 아니든, 그들은 시민이다. 시민은 다양하다. 때로 광기어린 독재자를 숭앙하기도, 그 독재자에 맞서 싸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 '익스펜더블'로 사람을 소모하는 일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너의 직분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동시에 미키를 동료로 아낀다. 그 사이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연대가 생기고, 그것의 부당함을 깨달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그 모두를 대원들이 꾸려낸다.
먼 외계행성을 배경으로 했지만 실상 우주선과 니플헤임은 현실의 축소판이다. 미키를 비인간적으로 소모하는 것-자본주의가 사람을 자본에 종속시켜 착취하고 소모시키는 것을 미디어로 숨기고 포장하여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나샤조차도..), 그리고 그 모습을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가책 없이 동조하는 사회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미키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시민들이다.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마샬의 혹세무민에 그저 흔들릴지라도, 사람 사이의 연대가 유대를 만들고, 지배자가 꾸며낸 이념을 뛰어넘는다. 마샬에게 저항하는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미키의 힘도, 나샤의 힘도 마찬가지다.
결국 미키는 기지-세상을 구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미키를 돕는다. 미키는 행동하는 시민이고, 그를 돕는 이들은 이웃이고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서 비로소 지도자가 탄생한다. 나샤는 모든 미키를 사랑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키와 함께 있었다. 그가 자본-세계의 욕망에 의해 희생될 때도 나샤는 죽어가는 미키 곁을 지켰다. 나샤는 우수한 자질을 지녔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사적인 재능은 미키를 사랑하며 더 넓어졌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통해 공적인 의지로 승화하고 현실이 되었다. 지도자는 함께하는 이들이 없다면 태어날 수 없다. 나샤를 돕는 동료들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결국 나샤는 함께하는 시민들이 탄생시켰다.
영화는 말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완벽하고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상상속의 영웅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성실함이 만들어낸다. 위대한 사유나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상식이다. 상식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실천하는 성실함이 세상을 지킨다.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치광이의 권력은 아직 강건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본다. 그들은 이제 벌거숭이가 되어 싸워야야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12월 3일의 밤, 수많은 미키가 국회를 지켰다.
우리는 모두 티모이고 도로시이고 미키이고 나샤이다.
더 연대하고 더 사랑하고 더 힘을 내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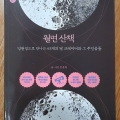 월면 산책
월면 산책

